현대의 실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 현대가 웬일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냐고 비꼴 때 쓰는 말이다. 제네시스도 그중 하나다. 지금은 토요타의 렉서스처럼 브랜드의 이름이 되었고 차명은 G80, GV80 등으로 부르는 그 차 얘기다.
2008년, 제네시스(정확히 말하자면 BH 제네시스)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개발을 담당했던 직원의 입장에서 그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본다.
회사에서 개발 중인 다른 차들은 프로젝트 코드만 들으면 그 정체를 잘 알 수 있었지만 제네시스의 최초 모델인 BH 제네시스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확정되고도 오랜 기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검토되던 2004년 당시, 쏘나타 이상의 대형차는 그랜저 아니면 에쿠스였고 그 밖의 차종이 있었다면 뉴그랜저(에쿠스의 전신)를 베이스로 전·후면부와 정숙성 등을 보강한 다이너스티가 있었다. 그래서 그랜저와 에쿠스가 아닌 다른 대형 고급 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대충 다이너스티 같은 차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웠던 시절이었다. 사내에서도 새로 개발한다는 차가 결국은 그랜저나 에쿠스를 베이스로 만드는 차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다수였다.
이놈의 BH는 코드 뒷자리가 H자이니 뒷자리가 G인 그랜저보다는 큰(고급) 놈이고 뒷자리가 Z인 에쿠스보다는 작은 놈일 것인데도 도대체 다른 회사의 어떤 차급과 비교해야 이해가 쉬울는지 몰랐다.
현대차는 그동안은 차의 세밀한 특성이나 성격까지 정의하면서 개발 방향을 정한다기보다는 목표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그리고 가격대가 우리 차의 목표수요층에 맞는 가격대의 차를 개발하는 것이 개발기준이었다.
그 당시, 판매본부 중역에게 중장기 차종 개발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제네시스는 BMW 5시리즈, 벤츠 E-CLASS, 렉서스 ES 등을 경쟁차종으로 설정하고 개발한다고 설명하자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수준에 무슨 BMW, 벤츠며, 그동안 후륜구동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차라고 두들겨 댔으면서 갑자기 무슨 후륜구동이며, 게다가 렉서스처럼 독립적인 고급 브랜드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표정이었다.
토요타가 처음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줄 모르냐고 거꾸로 묻기도 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도 BMW, 벤츠와 경쟁하는 차를 만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심지어 상품성이 비슷해도 가격은 반값이어야 할 것이라는 농담까지. 이런 사내 분위기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연구소의 개발 담당들은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
상품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시승을 많이 하게 된다. 연구소를 방문하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많든 적든 시승하는 것이다. 경쟁차와 비교 시승하기도 하지만 주로 새로 개발한 차의 시험차를 타보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기존모델과 비교해서 타보기도 했고. 주목적은 기존 차 대비 얼마나 성능이나 정숙성 등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제네시스는 달랐다.
시험차는커녕, 아직 디자인도 확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차의 형체도 없는 시점에 남양 연구소에 가면 시승을 해야 했다. 시승차는 개발에 참조하려는 경쟁차였다. 제네시스 개발을 위해 수많은 경쟁차가 수입되어 연구소로 들어왔다. 주로 BMW 5시리즈와 벤츠 E-CLASS가 들어왔고 렉서스도 일부 들어왔다.
회의실에서의 일정을 끝내면 삼삼오오 나뉘어서 주행시험장의 시승차를 몰고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했다. 그중에서도 통상 ‘벨지안로’라고 불리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많이 달렸던 기억이 난다. 유럽의 옛날 도로처럼 돌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길부터 파도치는 것 같은 도로까지 주로 승차감, 구체적으로는 서스펜션의 단단한 정도를 느끼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주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것이었다.
가장 서스펜션이 부드러워 출렁대는 렉서스부터 허리가 아플 정도로 노면이 느껴지는 BMW까지 어느 것이 제네시스의 갈 길인지 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시승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오면서 후배 직원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요즘 평생 시승할 차 다 타보는 것 같다고.
시승하는 사람들도, 연구소의 직원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차들이 대부분 승차감이 부드러운 북미 스타일로 개발되었기에(추후 i30이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단단한 BMW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북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미연구소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승을 했지만, 이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층은 BMW를, 연령층이 조금 있는 층은 벤츠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렇고.
판매 쪽의 의견도 달랐다. 국내영업과 해외 영업 부문을 대상으로 시승하면 국내는 렉서스 수준을, 북미는 벤츠와 렉서스 중간 수준, 또는 BMW와 벤츠의 중간 수준 정도를 요구했다. 짜장면 맛 나는 짬뽕? 냉면 맛 나는 칼국수를 만들라는건가? 연구소의 섀시, 주행 성능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말 많았던 엠블럼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차명은 결정이 되었고 차의 상징인 엠블럼을 독자 브랜드에 맞게(독자 브랜드로 런칭은 못했지만) 현대 엠블럼과는 다르게 별도로 디자인해 부착하는 것으로 정몽구 회장의 결재가 났다.
메이커마다 사명이나 차명의 첫 글자를 렉서스의 L자를 변형시켜 만들 듯이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동물을 형상화해 엠블럼을 만들기도 한다. 현대차는 현대의 첫 글자인 H를 형상화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제네시스의 G자를 형상화하는 방안으로 디자인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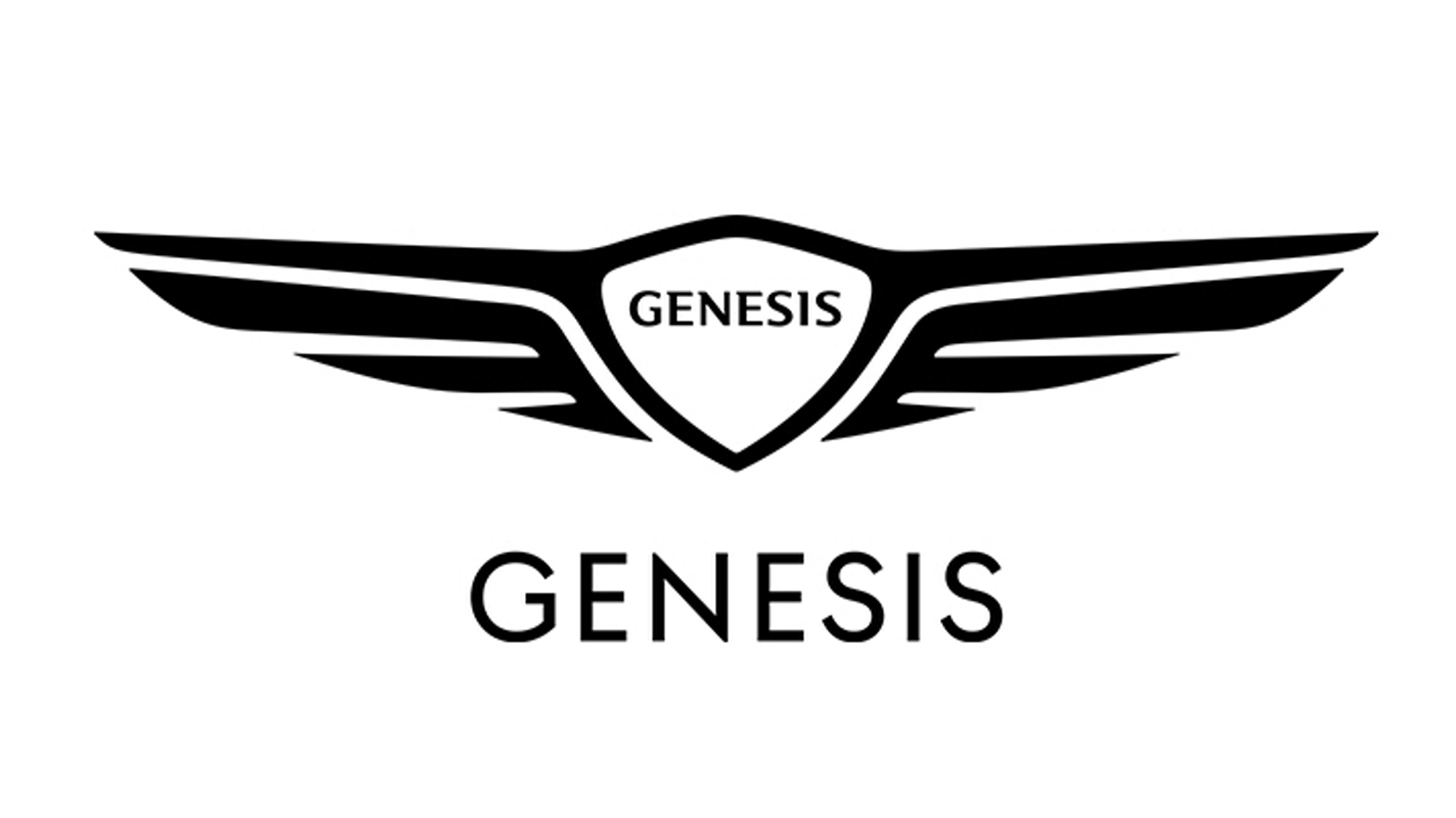
그러나 한 방향으로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므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고 그중에는 새의 날개 형상(WING)을 이미지화한 디자인도 포함되었다. 농담 삼아 말하는 독수리(벤틀리)와 참새(미니쿠퍼) 형상의 엠블럼 타입 말이다.
김동진 부회장이 최고경영층으로 본 품평에 참석하기에 전날, 각 부문의 본부장들이 모여 미리 예비품평하고 의견을 나눠 대강의 방향을 정했다. 이때 날개 형상 시안을 본 어느 본부장이 왜 남의 회사 엠블럼을 흉내 내냐면서 만에 하나라도 부회장이 덜컥 정해버리면 안 되니 치우라고 해 메인 시안에서는 제외했다.
다음날 열린 본 품평 자리, 여러 엠블럼을 안을 검토하던 김동진 부회장은 별로 맘에 드는 안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다급해진 디자인 부문에서는 뒤로 미뤄놨던 2차 시안까지 내놨다. 김 부회장이 살펴보더니 “이거 좋구먼” 하면서 한 시안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덜컥 결정이 되어버렸다. 모두 입을 모아 잘 선택하셨다고 하고. 벤틀리니, 참새네 했던 그 날개가 결국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되었다.
아뿔싸 했지만 쓸데없는 우려였다. 제네시스의 훌륭한 엠블럼으로 자리잡았으니 말이다.
유재형 <자동차 칼럼니스트>
필자 유재형은 198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중대형 승용차 상품기획을 맡았으며 현대모비스 전신인 현대정공에서 갤로퍼, 싼타모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로 옮겨 싼타페, 투싼 등 SUV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거쳐 현대자동차 국내상품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성하시려면logged in로 로그인하세요